[생활과학-1] 추울땐 미세먼지가 적고, 더울땐 미세먼지가 많은 이유 ㅜㅜ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늘 화제인 미세먼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겨울과 봄철에 날이 추우면 미세먼지가 적고, 따뜻해지면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이유”가 궁금하신 적 있으시죠?
미세먼지가 적어서 나갈라카면 너무 춥고, 따뜻해져서 나갈라카면 미세먼지가 많고.... 아놔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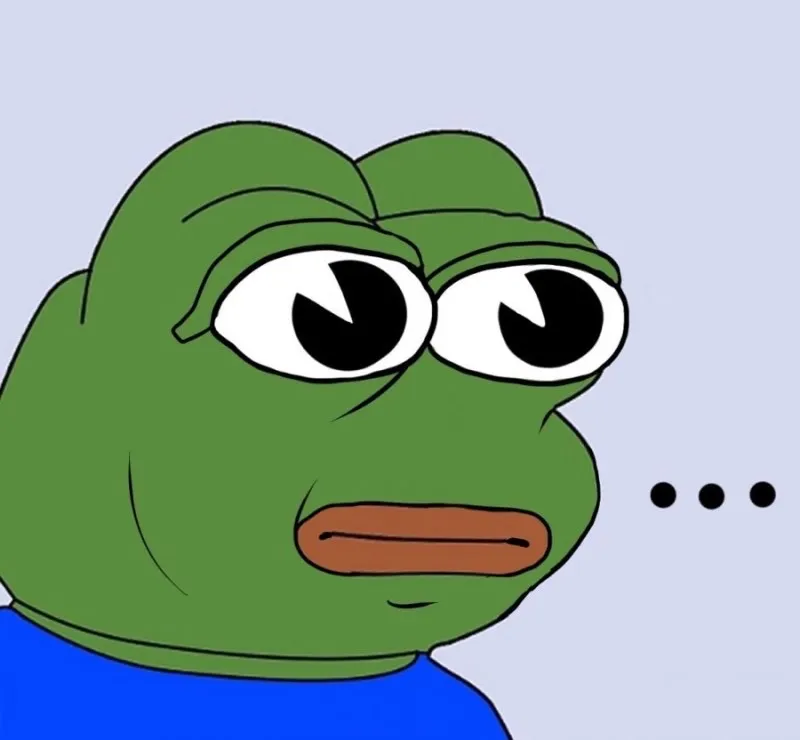
저도 이 현상이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알아갈수록 날씨와 대기의 관계가 흥미롭더라고요. 더불어 요즘 “과거보다 미세먼지가 많아진 걸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도 함께 풀어볼게요.

바람이 부는 원리
우선 바람이 부는 원리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릅니다. 쉽게 말하면 공기가 밀집된 지역(고기압)에서 공기가 부족한 지역(저기압)으로 공기가 흐른다는 것이지요. 당연한 것이죠? 모든 만물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이치니까요. (아... 우리나라 인구는 예외로 많은곳으로 계속 몰리네요;;^^) 그런데, 공기가 밀집된 지역이 발생한 이유가 중요하죠. 고기압인 지역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곳이고, 낮은 온도의 대기는 높은 온도의 대기보다 밀도(쉽게 말해 무게)가 더 크기 때문에 지표면에 공기가 밀집되죠. 반대로 저기압인 지역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곳이고, 높은 온도의 대기는 낮은 온도의 대기보다 밀도(쉽게 말해 무게)가 더 작기 때문에 하늘로 공기가 밀집되죠. 그래서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추운 날씨와 미세먼지의 관계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철, 특히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엔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명쾌합니다. 바로 바람 때문이에요. 겨울엔 시베리아에서 차갑고 무거운 고기압이 내려오면서 북서풍이 강하게 붑니다.

이 바람이 공기를 환기시켜 미세먼지를 흩어버리죠. 집안 먼지를 창문 열고 날리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난방 때문에 미세먼지가 생길 수 있지만, 강한 바람이 이를 날려버리는 효과가 더 크곤 합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공기가 맑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차가운 공기가 건조해서 먼지가 덜 떠다니는 점도 한몫하고요.
따뜻한 날씨와 미세먼지의 증가
반면 봄이 오면서 날이 풀리면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걸 느낍니다. 여기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대기 정체’와 ‘온도 역전’이에요.

대기 정체는 말 그대로 공기가 한곳에 머무는 현상입니다. 봄철엔 겨울처럼 강한 고기압이 약해지고 바람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미세먼지를 날려버릴 힘이 부족해지고, 특히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나 미세먼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온도 역전은 조금 낯선 개념일 수 있는데요, 보통 공기는 위로 갈수록 차가워지지만, 이 경우 지표 근처가 차갑고 상층이 따뜻해집니다. 예를 들어, 봄철 새벽에 땅이 차가워지며 공기가 식고, 상층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상태로 남아 있죠. 이렇게 되면 대기가 안정적이어서 공기가 섞이지 않고, 미세먼지가 지표 근처에 갇히게 됩니다. 처음엔 “지표가 따뜻해지면 공기가 올라가지 않나?“라고 생각했지만, 밤에 만들어진 차가운 공기층이 낮에도 유지되며 상층이 뚜껑처럼 막는 경우가 많아요.
계절과 지형의 영향
봄철엔 황사까지 겹치면서 미세먼지가 더 두드러집니다. 반면 겨울엔 강한 바람이 외부 미세먼지 유입을 줄여주죠. 우리나라처럼 분지 지형이 많은 곳에선 온도 역전이 자주 생겨 공기가 빠져나가기 어려운 점도 문제입니다. 서울 같은 도시는 주변 산 때문에 미세먼지가 더 쌓이기 쉽죠.
과거엔 어땠을까? 미세먼지가 정말 많아진 걸까?
요즘 미세먼지를 보면 “과거엔 이렇게 심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과거엔 미세먼지가 덜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걸까요? 이 궁금증을 풀어보려면 90년대 이야기를 꺼내봐야겠죠.

사실 1990년대에도 미세먼지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PM10(입자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을 측정하기 시작한 건 1995년부터인데, 당시 서울의 연평균 농도는 7080㎍/㎥ 정도였어요. 지금(2020년대 기준 3040㎍/㎥)과 비교하면 꽤 높죠.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매연, 석탄 난방이 주요 원인이었고, 봄철엔 황사도 심심찮게 찾아왔습니다. 다만 “미세먼지”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공기가 탁하면 “안개”나 “먼지” 정도로 여겼고, 건강 문제로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0년대엔 지금처럼 중국발 미세먼지가 큰 이슈는 아니었어요. 중국의 산업화가 2000년대부터 급격히 늘면서 그 영향이 커졌거든요. 반면 국내 오염원은 시간이 지나며 규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 과거에도 미세먼지가 있었지만, 최근엔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가 특정 날을 더 악화시키면서 “심해졌다”고 느끼는 측면이 큽니다. 게다가 요즘은 실시간 농도 앱과 뉴스 보도로 미세먼지를 더 민감하게 체감하게 됐죠.
결론적으로, 날이 추우면 바람과 차가운 공기가 미세먼지를 날려주고, 따뜻해지면 대기 정체와 온도 역전으로 미세먼지가 갇힙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미세먼지는 있었지만, 우리가 이를 잘 몰랐고, 최근엔 외부 요인과 인식 변화로 더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국내 노력과 국제 협력이 둘 다 필요하겠죠. 여러분은 미세먼지와 날씨, 그리고 과거와의 차이를 어떻게 느끼시나요? 의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요리과학-불고기] 마리네이드. 고기를 더 고기답게 먹는 방법 (1) | 2025.04.15 |
|---|---|
| [요리과학-카레] 향신료와 마이야르 반응의 화학적 춤 (0) | 2025.03.14 |
| [요리과학-배추찜] 이연복 셰프의 배추찜 속 과학원리! 알고 먹자 (feat. 레시피) (1) | 2025.03.10 |
| [요리과학-소고기무국]소고기 무국을 끓일 때 사용되는 참기름이 발암물질을 일으킨다고? 참기름에 대한 오해와 진실 (0) | 2025.03.06 |
| [영양제-4]아연(Zn), 왜 꼭 필요할까? (0) | 2025.03.02 |





